정부가 최근 일부 업종·직종에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일부 업종·직종은 주 52시간이 넘는 노동을 허용해도 괜찮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 안전보건 전문가와 해당 업종 노동자들이 정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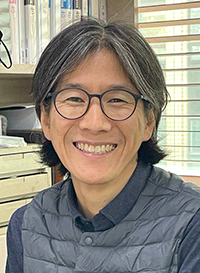
“연장수당 추가로 지급하겠다. 몇 시간만 더 일하자.”
영화·영상 제작현장에서 법정 최대 근로시간 내에 계획한 촬영분을 마치지 못했을 때 제작사가 스태프에게 하는 말이다. 이런 회사의 요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합원이나 일반 스태프들이 노조에 자주 물어본다. 스태프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법 기준을 넘는 것은 말 그대로 위법한 사항이라고 답한 후, “스태프께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대답은 이렇다. “돈은 필요 없고 딱 법 대로만 했으면 좋겠다.”
대다수 스태프의 속마음은 다르지 않았다. 다만 매번 작품마다 일자리를 새로 계약해야 하는 산업의 특성상, 부서 상급자와 제작사의 눈치를 보느라 강하게 주장하기 어려울 뿐이다. 영화·영상 제작스태프 현장의 80~90%가 20~30대 노동자다. 이들 스태프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시간은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화제작 현장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시작으로 근로시간을 조금씩 지켜 나가기 시작한 게 2015년의 일이다. 아직 10년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로 장시간 노동에 면죄부 주려는 정부와, ‘이때다’ 싶은지 동조하는 일부 제작자들이 분노를 유발한다.
제작사 관계자 중 일부는 연출·제작·미술부서 등에서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장시간 업무가 빈번하다는 이유로 ‘차라리 연장근로시간 관리 기준을 확대하자’고 하기도 한다. 어차피 주 52시간을 초과하고 있고, 앞으로도 초과할 테니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출·제작·미술부서 스태프의 업무에는 촬영 일정 짜기, 배우 일정 관리, 다음 촬영의 미술 사전작업, 촬영장소 사전 헌팅 및 예약업무 등이 있다. 일의 특성상, 각자 숙소로 돌아가서도 노트북과 핸드폰을 들고 다른 스태프 및 타 부서원 숙소를 오가며 업무를 진행하기도 한다. 주 52시간 제한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가려진 노동, 계산되지 않는 근로시간’ 중 하나다. 제작사는 카메라 셋업과 연기가 이뤄지는 촬영시간은 1주 52시간 등 법 기준에 맞추고, 필수업무임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일은 ‘어쩔 수 없다’며 모른 척한다.
하지만 처음 영화·영상 산업에 주 52시간 제한이 적용됐을 때, 촬영현장에서도 ‘법 지키며 못 찍는다’고 했다. 지금은 최소한 촬영 시간은 주 52시간을 지키는 것이 원칙이 됐고, 문제없이 촬영하고 있다. 연출·제작·미술 부서에서 52시간 넘게 일하는 경우가 많다면, 법적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현장팀과 준비팀을 분리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할 일이다. ‘이미 법을 어기며 장시간 노동하고 있으니, 차라리 법을 바꾸자’는 이상한 논리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게다가 이렇게 일을 시킬 때, 임금이라도 제대로 지급할지도 믿을 수 없다. 제작예산이 부족하면 언제나 인건비부터 낮추는 것이 현실이다. 더 길게 일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월급 총액은 유지돼 시간급만 삭감되는 결과가 될 우려도 크다.
연장근로 관리단위 확대는 “장시간 노동이 필요하면 얼마든 할 수 있는 제도”와 같은 말이다.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사용자의 효율만 따지며 일 시키겠다는 얘기다. 정부와 사회가 만든 과로사 기준보다도 더 긴 노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간을 기계 부속 취급하는 정책이다. 더 일하고 더 받으면 좋은 거 아니냐고? 노동자에게는 죽을 듯이 일해서 사장 지갑을 채워 달라는 소리로만 들린다.
장시간 노동을 하면 좋은 영화가 만들어지는가? 설사 좋은 영화가 나온들 사람 짜서 비누 만든다는 괴담과 뭐가 다른가? 누구나 영화·영상 K-콘텐츠를 ‘자랑’한다. 하지만 노동자는 쓰고 버리거나 교체하면 그만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K-콘텐츠는 ‘노동착취 콘텐츠’일 뿐이다. 피와 고통이 배인 콘텐츠는 절대 매력적인 문화가 될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연장근로 기준 확대와 같은 개악을 멈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