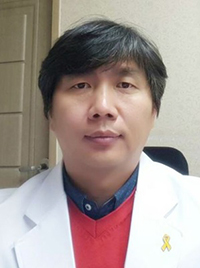
밤샘 노동을 하던 ‘서방님의 손가락은 여섯 개’였다. 프레스기로 노동자들의 손가락을 제품과 함께 잘라 가며 수출하던 나라에서는 그랬다. 10대 여공들이 잠을 쫓는 약에 풀어진 눈으로 시다판에 피 섞인 가래를 토하며 옷을 짓던 나라였다. 그런 나라에서 있으나 마나 했던 근로기준법 준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자기 몸을 불살라야 했다. 강남 벌판에 쑥쑥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늘어갈수록 공사판 바닥으로 떨어져 내리는 노동자들도 늘었고, 부러지고 부서진 노동자들의 뼈로 골조를 세우는 나라였다. 열일곱 소년노동자가 온도계와 압력계를 만들다 수은과 유기용제 중독으로 죽어 가고, 노동자 수백 명이 이황화탄소로 쓰러지고 미쳐 가도 독재의 그늘을 감출 올림픽은 축제가 돼야 했다. 그나마 일터와 세상이 조금씩 나아진 것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뭉치고 공장의 울타리를 넘어 거리로 나서기 시작하면서였다. 이 나라의 꼴이 그나마 제대로 잡힌 것은 그런 노동자들의 투쟁과 노동 덕택이었다.
노동자들이 일군 호황은 금융정책을 망친 정치, 거기에 기대 은행 빚으로 과잉투자에 골몰한 기업, 돈 벌기 만만한 나라로 만들려는 국제자본이 초래한 외환위기로 무너졌다. 노동자들은 맨몸으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남은 노동자들은 엄청난 노동강도로 골병에 시달렸다. 쫓겨났던 노동자들이 공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작업복과 명찰을 바꾸고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돼야만 했고 더 위험하고 궂은일을 감수해야 했다.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일상적 구조조정과 살인적 노동강도가 불러온 골병, 근골격계질환의 고통에 시달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노동자들이 다시 뭉쳐 거리로 나서기 시작해서야 외환위기 극복이 누구의 피와 땀으로 이뤄진 것인지 돌아보게 됐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분절화 흐름은 되돌리지 못했고 어긋난 정책과 정치로 고착돼 갔다. 위험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로 계속 흘러내려 쌓였다. 더 위험해진 이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권력 없는 노동자, 비정규직, 여성·청소년·고령·이주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은 지속됐고 나라는 점점 더 잘살게 됐지만 부(富)와 안전·건강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각해졌다. 사회는 점점 안전해지는 것 같았지만 일터에서 죽고 다치는 일은 여전했고, 아무리 애써도 사고는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들 여겼다. 매일 한두 명씩 죽어 가는 것은 일상으로 여겨졌다. 한꺼번에 수백 명의 생명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세월호의 충격으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사고가 그냥 나고 사람들이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작동하지 않는 시스템이 사고를 일으키고 방조하고 생명을 앗아 간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터에서 일어난 죽음도 다시 보이기 시작했다. 성장과 풍요를 위해 치러야 할 기회비용이 아니라 잘못된 구조와 작동하지 않는 법·제도 문제라는 것을 공감하기 시작했다. 휴대전화기 부품공장에서 실명한 파견노동자들,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끼여 숨진 청년노동자, 생수공장 포장기계에 끼여 숨진 현장실습생 이야기에 움직였다. 2018년, 노동자 김용균의 처참한 죽음이 알려지고 유가족·노동자들과 함께 시민들은 거리로 나서서 싸웠다. 30년 만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을 이끌어 냈다. 기업의 안전보건 체질 개선은 기존의 법을 넘어 책임을 물을 대상과 기준의 문제로 여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이런 연원을 가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최초 기소된 두성산업이 지난 13일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판부에 신청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아시아 최대규모라는 SPL 제빵공장에서 덮개도, 자동 멈춤장치도 없는 배합기에 끼여 노동자가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수사가 진행될 것이다. 그럼에도 회사는 바로 다음 날 노동자가 끼여 죽은 기계만 가린 채 공장을 다시 돌렸고 이는 한 장의 사진으로 언론에 실렸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선량한 이들은 빵 한 조각 베어 물기 힘겨웠다. 하물며 수의 같은 흰 천을 덮은 기계 옆에서 죽은 노동자를 떠올리며 일해야 했을 동료 노동자들은 어떠했겠는가? 감수성의 문제를 넘어서 야만이다. 건물이 올라가면 건설노동자들이 떨어지고, 하청노동자의 몸을 갈아 발전기를 돌리고, 마실 물을 정수하기 위해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질식하고, 청년노동자의 살점을 같이 반죽해 빵을 만드는 나라에서는 일말의 죄책감 없이는 자고, 먹고, 마시기도 어렵다. 그러나 두성산업이나 SPL 같은 기업은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이 안중에 없고 오로지 오너(owner)의 안위와 이윤이 문제였던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떠들던 명확성·실효성 운운하던 많은 기업들은 무엇이 다를까?
법 하나로 세상이 바뀐다고 믿을 만큼 순진하지도 낙관적이지도 않다. 하지만 이들 기업의 행태를 보니 법 하나라도 지켜 내야겠다. 만고불변의 법리가 어디에 있겠는가? 처벌로 예방을 도모할 수 있는지 논하기에 앞서 이런 야만 앞에서는 몽둥이가 약이겠다. 노동자를 위험에 내몰려면 손모가지 하나 정도는 내놓거나 ‘쫄리면’ 제대로 바꾸시던가 상식적 사회의 으름장으로라도 지켜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