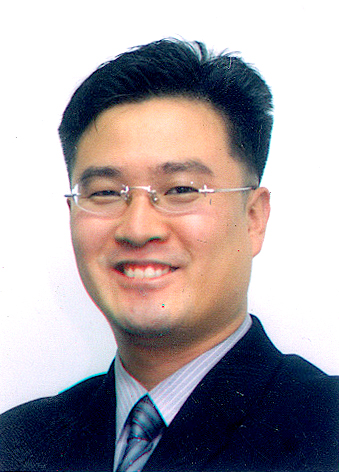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20대 총선에서 흥미로운 ‘정치실험’을 했다. 공공연맹은 29명의 전략지역 후보를 선정하고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 결과 25명(86.2%)이 당선됐다. 언뜻 보면 매번 총선 때마다 여러 노조들이 해 오던 특정후보 지원운동과 다르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왜 이를 ‘정치실험’이라고 부른 걸까.
공공연맹이 선정한 29명 후보를 살펴보면, 기존 노동계 시각으로 보기에는 좀 어색한 후보들이 들어 있다. 그중에서 서울 용산구에 출마한 진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눈에 띈다. 주지하다시피 진영 후보는 총선 직전 새누리당을 탈당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다.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 5법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런 면에서 보면 진영 후보는 ‘반노동 후보’로 낙선 대상에 올려 마땅하다. 그런데 지난 한 해 동안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엄동설한에 국회 앞 천막농성까지 벌였던 공공연맹이 진영 후보를 열심히 지원했다.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까.
‘노동개악법’ 발의 후보를 지원한다?
바로 이 부분이 그간 노동계가 주로 해 왔던 총선 대응방식과 다른 점이다. 공공연맹은 이번 총선 방침을 한국노총 방침과 같이 ‘반노동정당 심판’으로 정했다. 노동계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이 들으면 좀 허무맹랑하겠지만 공공연맹의 총선 목표는 ‘집권여당 과반의석 붕괴’였다.
현실은 막막했다. 공공연맹에는 100여개 단위노조가 있지만 조합원은 4만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작은 조직이 집권여당 과반의석 붕괴라는 거창한 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황당하기 이를 데 없다. 그런데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뤄 내야 할 목표치였다. 더구나 공공연맹이 내부적으로 총선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당시 새누리당은 170~180석을 장담하고 있었다. 과반의석을 붕괴시키려면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 최소한 20~30명의 야권 당선자가 나와야 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할까. 목표 달성까지는 못하더라도 총선 결과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연맹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눈에 번쩍 띄는 사례 하나를 찾아냈다. 1997년 영국 총선에서 노동조합이 택한 전술이었다. 영국 노조들은 노동당·노동조합 연락기구(TULO)를 통해 여야 간 박빙이 예상되는 93개 전략지역(key seat)을 선정해 선거운동 인력과 재정을 지원했다. 노동당은 무려 92곳에서 승리했다. 이로 인해 노동당은 418석(63.4%)를 점유하는 대승을 거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치러진 1945년 선거 이후 가장 큰 승리였다. 이로써 보수당의 18년 장기집권이 끝났다. 영국 노조들은 이후 총선에서도 이를 확대해 노동당 역사상 처음으로 내리 세 번의 총선에서 승리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영국의 전략지역(key seat)
바로 이것이다. 공공연맹은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기로 했다. 첫 실험이니만큼 ‘능력이 미치는 수준’과 ‘실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에서 전략지역을 정하기로 했다. 19대 총선 결과와 20대 총선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비공개 내부 조사자료를 죄다 모아 박빙지역과 열세지역을 분석했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선거지원을 위해 연맹 소속 단위노조와 조합원 분포 현황도 활용했다.
박빙지역은 1등과 2등 후보의 예상득표율이 3% 이내인 지역을 말한다. 투표 참여 호소와 지원으로 지역당 약 100표에서 1천표를 움직일 수 있다면 낙선될 후보가 당선자 반열에 서게 된다. 그런 점에서 공공연맹은 전략 29명 후보 모두를 당선시키면 집권여당의 과반의석 붕괴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공식 선거운동 직전 공공연맹 내에서 부위원장단과 사무처로 구성한 ‘정치위원회 회의’를 열고 ‘친노동후보’ 12명과 ‘박빙열세 후보’ 17명 등 29명의 전략후보를 선정했다. 친노동후보는 19대 국회에서 노동법 개악을 막는 데 기여했거나 평소 단위노조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왔거나 노동계 출신들이었다. 반면 나머지 17명 대부분은 노조들과 일면식도 없던 소위 말해 누군지도 모르는 후보들이었다. 그럼에도 공공연맹은 17명의 당선에 집중하고자 했다. ‘집권여당 과반 붕괴’라는 목표에 조금이라도 근접하려면, 친노동 후보 12명은 물론 박빙열세 17명의 당선이 매우 중요했다. 서울 용산구의 진영 후보는 노동계와 그다지 친하지 않지만 집권여당 과반 붕괴를 위해서는 반드시 당선시켜야 할 말 그대로 ‘전략후보’였던 것이다.
친노동후보와 전략후보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자, 공공연맹은 본격적으로 선거 지원에 나섰다. 전략지역별로 담당 단위노조를 배정하고, 인력 지원과 재정 지원을 독려했다. 단위노조들은 각자 담당 지역구에서 연맹 소속 조합원들과 가족들의 선거 참여를 호소했다. 일찍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방식이었지만, 이 방식 외에는 선거 결과를 실질적으로 변화시켜 낼 마땅한 다른 수가 없었다.
4월13일 늦은 밤 총선 결과가 집계됐다. 공공연맹 선정 29명의 전략지역 후보 가운데 25명이 당선됐다. 새누리당 과반의석이 붕괴됐다. 국민의 힘으로 16년 만에 여소야대를 만들어 냈다. 노동계 처지에서 보면 ‘반노동정당 심판’이었다.
물론 이번 총선 결과는 공공연맹이 홀로 이룬 성과는 절대, 결단코 아니다. 다만 이런 총선 대응방식의 유효함을 조금이나마 입증했다는 점, 그리고 첫 실험이 성공했다는 점에서 노동계 전체에 던지는 시사점이 크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런 방식의 효과성이 입증될 경우 의정활동 과정에서 전략후보 당선자와 특정 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새롭게 맺어 가는 단초가 될 수도 있다. 말 그대로 특정 정당과 노동조합의 ‘전략적 제휴관계’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 결과는 ‘노동의 정치세력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수준에 이르면 “표가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계가 반대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들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차기 총선에서 노동계가 하나 돼 전략지역을 선정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한다면 어떻게 될까. 벌써 21대 총선이 기다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