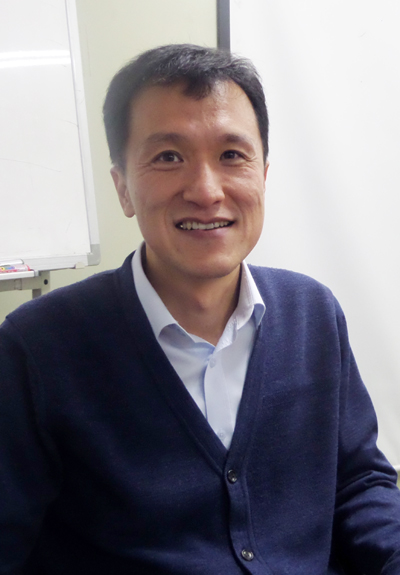
“한국 산별노조운동은 산업별 임금교섭 성사를 위해 20년간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안착되지 않았다. 앞으로도 불가능할 것이다. 실현되지도 않았고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목표에 더 이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 산업별 임금교섭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지 못한 것은 노조 지도자나 노동자들의 책임이 아니다.”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회의실에서 열린 양대 노총 산별노조 연석회의 주최 초청간담회에서 만난 이철승(45·사진) 미국 시카고대 교수(사회학)의 문제제기는 도발적이었다.
우리나라 산별노조운동은 1990년대 “진보정당과 산별노조가 함께 발전해야 한다”는 이른바 유럽식 ‘양 날개론’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대산별노조를 건설해 기업별노조를 뛰어넘는 산별교섭으로 연대와 평등에 입각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였다.
이 교수는 “그런 목표를 누가 심어 줬냐”며 이런 흐름에 정면으로 맞섰다. 또 “한국 현실에 맞는 전략이냐”고 되물었다. 심지어 “한국 사회 여건상 산업별 임금교섭은 불가능하다”며 “그만두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산별노조가 중앙에 집중된 자원을 활용해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정치개입을 확대해 국가를 매개로 한 사회복지 확대 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별교섭을 통한 임금연대(임금격차 축소)는 불가능하니 국가·정치권력(정당)에 개입해 복지확대와 평등을 실현하는 전략을 모색하라는 것이다. 그동안의 활동방식을 바꾸라고 조언한 셈이다.
그럼에도 이날 간담회에서 그의 주장을 듣던 10여명의 산별노조·연맹 정책 담당자들은 크게 반발하지 않았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전략기획단장은 “산별노조가 산별교섭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통한 노동시장에서의 평등을 목표로 활동했지만 실제로는 잘 풀리지 않았다”며 “이 교수의 주장이 현실적 고민의 한 단면을 담고 있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산별노조 활동방향을 임금교섭 같은 노동시장에서 찾기보다는 정치나 사회운동 차원에서 찾으라는 새로운 제안은 고민해 볼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의 진단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 한국과 브라질·아르헨티나·대만의 노동·시민운동 발전 과정과 복지국가 형성 과정을 연구하면서 도출한 결과다.
그가 2013년부터 시작한 연구는 최근 <연대가 실현될 때 : 노동개혁 시대의 노동·시민 네트워크와 복지국가>(When Solidarity Works: Labor-civic Networks and Welfare States in the Market Reform Era)라는 책으로 엮여 출간됐다. 이 교수는 최근 국내 번역본 출간을 위해 한국을 찾았다.
- 우리나라 산별노조 운동을 어떻게 평가하나.
“한국은 산별노조 수준을 평가할 때 산업별 임금교섭이 어느 수준인지(중앙산별교섭을 하고 있는지)와 이를 통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임금을 인상했는지 두 가지 잣대를 주로 쓴다. 국내 연구들이 이런 방향에서 이뤄졌다. 노동계도 지난 20년 동안 산별 임금교섭 성사를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했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은 전형적인 서유럽, 독일식 모델일 뿐이다. 산별노조 역할과 평가 잣대는 다양할 수 있다. 한국 진보·노동계는 유럽 모델을 도달해야 할 하나의 이상으로 설정하고 따라가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서구 유럽과 개발도상국인 우리나라는 역사와 문화, 경제발전 과정이 전혀 다르다. 한국의 역사적 경험과 현실 조건에 맞는 한국형 산별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유럽보다는 개발도상국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는데.
“우리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민주화를 이루고 복지를 확장한 나라들이 오히려 참고할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한국과 브라질·아르헨티나·대만을 연구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3년간 노조 지도자 100여명을 인터뷰하고 노동·시민운동과 관련한 다양한 자료를 모았다. 연구 결과를 담은 책에서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정치권력 간의 관계를 다루면서 복지국가 확장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살폈다. 결과적으로 노동운동이 시민운동과 강하게 결합할 때에는 복지가 확장했지만 반대일 경우는 되레 축소되는 결과까지 나왔다. 노동운동과 국가권력(정당)과의 관계는 노동자 정당이라도 특정 정당에 종속되지 않고 자율성을 가질 때 노조의 영향력이 확대하는 경향이 강했다.”
- 개발도상국 상황은 어떤가.
“브라질은 노동자 혹은 노조 중심주의를 둘러싼 논쟁이 20년 전에 끝났다. 지금은 노조들 스스로 ‘시민주의적 노동운동’이라고 부를 정도로 생활밀착형 노동운동 성향이 강해졌다. 이를 기반으로 브라질 좌파노동자당(PT당)이 성장했고 집권까지 했다. 그런데 브라질 노동계는 스스로 PT당을 만들고서도 당과의 관계에서는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룰라 다 실바를 지지했지만 그와 여러 차례 크게 싸우기도 했다. 브라질 노동계가 여전히 진보적이고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기반이다. 대만은 매우 특이하다. 대만 노동계는 투쟁력이 제로에 가깝다. 심지어 국가권력에 종속적이다. 그럼에도 시민사회와의 연대 관계가 강하다. 대만 노동계는 높은 수준의 정책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정치세력과의 협상을 통해 노동자 권리를 향상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투쟁역량이 강한 우리나라보다 노동자 권리와 영향력이 훨씬 크다. 신기할 정도다.”
실제 2014년 국제노총(ITUC)이 발표한 세계 노동권리지수에서 한국은 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았지만 대만은 호주·영국과 함께 3등급으로 분류됐다.
- 한국 노동계 상황을 진단한다면.
“1990년대 중·후반까지는 민주노총이 노동·시민사회 투쟁과 정책 모두를 주도하거나 연계하는 중심축에 있었다. 금속노조도 대기업노조와 시민사회를 연계하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2000년대 말에 오면 노동·시민사회 네트워크 연계도에서 금속노조가 완전히 사라진다. 민주노총은 투쟁의 중심축에 여전히 존재했지만 정책라인에서는 사라졌다. 대신 강력하게 등장한 것이 참여연대다. 노동·시민사회 정책은 거의 참여연대가 주도하거나 그 단체를 매개로 만들어지고 있었다. 실제 조직 구성을 살펴봐도 교수·전문가 집단은 노동계에 있지 않고 참여연대에 있다.”
- 산별노조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산별노조는 기업별로 흩어진 자원들을 중앙으로 결집시켜 가장 필요하거나 혹은 가장 약한 부분에 재분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 역량을 가능하지 않을 임금교섭 성사에 쏟아붓기보다는 노동자를 위한 싱크탱크를 만드는 데 사용해야 한다. 정책역량 강화를 통한 정치개입으로 국가·사회적인 복지 확대와 평등을 실현하는 데 산별노조가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 특이할 정도로 국가권력(대통령)이 모든 자원의 배분을 통제하는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다. 다시 말해 국가권력 개입을 통한 복지 확대와 평등 실현이 어느 나라보다 쉽다는 의미다. 정책노조·정치노조가 답이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