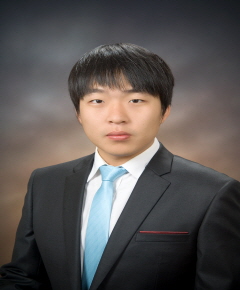
“우당탕!”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발길질 한 번에 폴리스라인이 우르르 쓰러졌다. 발길질은 연거푸 이어졌다. “왜 사람이 들어오는 걸 막느냐”는 고성이 귓등을 때렸다. 경찰은 심드렁한 표정으로 폴리스라인을 다시 세웠다. 지난 27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 꾸려진 세월호 유가족의 농성장 풍경이다.
폴리스라인을 쓰러뜨린 당사자는 세월호 참사로 아들 최성호군을 잃은 아버지 최경덕씨다. 최씨는 “아들 냄새가 그립다”며 종종 아들 옷을 입고 농성장에 나온다. 그런 그가 경찰의 폴리스라인을 쓰러뜨린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일단 농성장에 가려면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경복궁역 인근부터 지키고 있는 경찰은 농성장에 가까워질수록 많아진다. 경찰 수십 명의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뚫고 농성장에 도착해도 유가족은 만날 수 없다. 경찰버스 10대가 농성장 주변을 켜켜이 에워싸고 있기 때문이다.
지지방문을 온 시민들은 대부분 농성장 건너편에서 “힘내세요”라고 외친 후 발걸음을 돌린다. 시민단체가 방문하더라도 대표자 정도만 출입이 가능하다. 그것도 경찰과의 실랑이를 거친 후에 말이다.
이달 25일에는 지지방문을 온 서울대·경희대 학생들이 농성장 코앞에서 경찰에 가로막혔다. 학생들은 발을 동동 굴렀다. 단원고 희생자 고 오영석군의 어머니 권미화씨는 박스 위에 올라 까치발을 한 채 “감사합니다”라고 학생들을 향해 연방 외쳤다.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쏟아지는 가시 돋친 말에 상처받은 유가족들에게 격려의 메시지가 얼마나 간절했을까.
세월호 농성장은 1천만 시민이 사는 서울 속 섬이다. 가까이 가도 볼 수 없고, 제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는 유배지다.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라”는 유가족과 시민의 호소는 경찰에 가닿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2011년 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경찰의 차벽은 굳건하기만 하다. 농성장 출입을 자유롭게 허용한다고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이 폭력시위대로 돌변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 몰래 눈물을 훔치던 경찰, 바다를 넋 놓고 바라보는 실종자 가족에게 우산을 씌워 주는 경찰, 불과 몇 달 전 우리가 본 경찰의 모습이다.
팽목항에서 눈물 흘리던 유가족도,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농성 중인 유가족 모두 진도 앞바다에 자식을 묻은 사람들이다. 국민의 경찰이라면 자식을 앞세운 유가족의 심정을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 더 이상 세월호 유가족을 섬에 가둬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