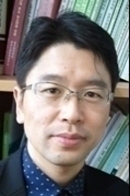
공인노무사
(노동법률원·법률사무소 새날)
A씨는 회사 퇴사 후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뒤 투병 중 사망했다. 이후 노조의 ‘직업성암 집단 산재신청사업’을 통해 산재신청을 했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의 사망원인인 백혈병이 업무(도장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산재로 승인되지 않았다. 사망시점으로부터 3년2개월이 지났다는 이유였다.
B씨는 플랜트 건설노동자로 근무 중 폐암을 진단받았다. 투병생활이 시작됐고 3년이 될 무렵 산재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단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승인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산재로 인정받았지만 2심 계류 중 숨졌다. 유족이 소송을 수계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산재 판결이 내려졌다. 결국 폐암 진단 후 6년 만에 사건이 종결됐다.
A씨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직업병으로 판단했지만 사망시점부터 3년이 지나서 산재를 신청했기 때문에 유족은 공단으로부터 단 한 푼의 급여도 받지 못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법 제112조는 시효 규정을 두고, 동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동법 제36조에 따른 권리, 즉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 등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시효가 완성된다.
A씨의 유족이 2개월만 빨리 산재신청을 했으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수령할 수 있었다. A씨의 경우 산재가 인정됐다면 유족은 월 300만원 정도의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었다. 당시 미망인이 40세였다. 최소 40년간 받는 유족연금총액이 최소 15억원 정도로 평가된다.
반면 B씨는 소송을 통해 산재로 인정돼 유족은 폐암 치료가 시작된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요양비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부인이 지속해서 간호해 왔으므로 간병급여도 수령했다. 또한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질병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유족연금 또한 당연히 수령할 수 있었다.
두 노동자의 사망 모두 업무로부터 기인했지만, 불과 2개월이라는 신청 시점의 차이가 비교할 수 없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산재보험법이 요양급여든, 유족급여든 사안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3년이라는 짧은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서 비롯된 문제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채권 및 소유권 이외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162조) 민법상 이자·부양료·급여·사용료 등은 3년의 시효로 규정된다.(민법 제163조)
산재보험법상 유족급여의 권리가 일반채권도 아닌 ‘이자’나 ‘사용료’ 정도로밖에 평가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 중 하나인 유족급여는 소멸시효가 5년이다. 공무원연금법 제81조5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단기급여는 3년간, 장기급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법상 연금급여 권리도 5년이다.
유족급여는 요양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한 가족의 운명이 걸린 문제다. 공무원연금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해 볼 때 3년이라는 짧은 유족급여 시효는 타당하지 못하다. 뿐만 아니라 산재에 대한 모든 입증이 그 유족과 근로자에게 있는 점, 대다수 노동자들이 자신의 질병이 산재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주들의 적극적 산재신청과 조력이 없고 오히려 방해와 은폐가 성행하는 현실을 직시하면 유족급여의 시효를 최소 5년으로 변경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